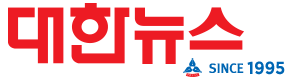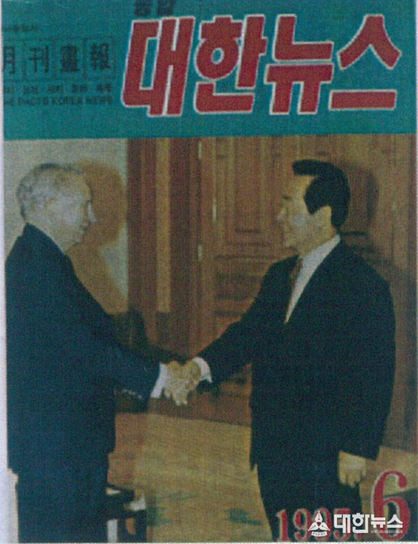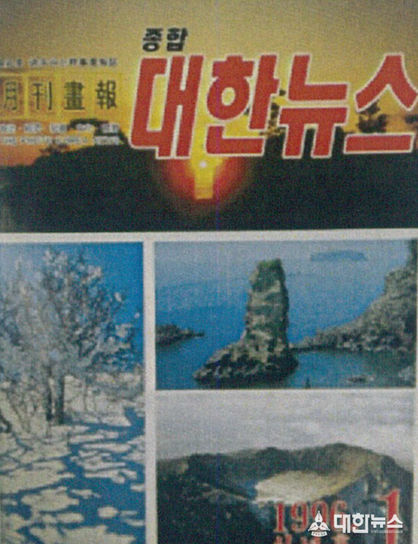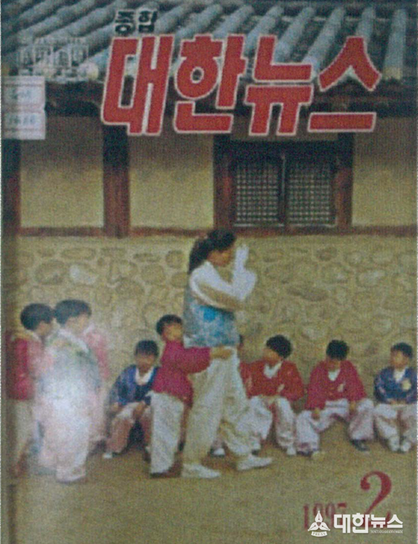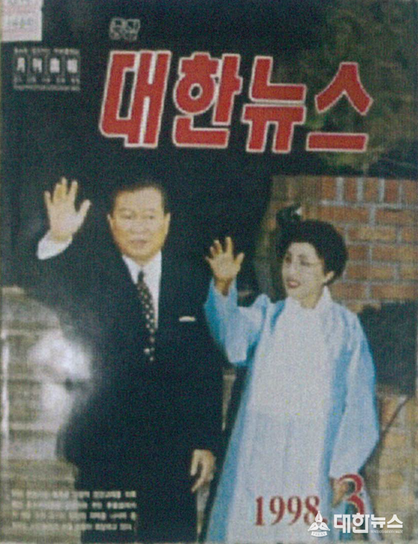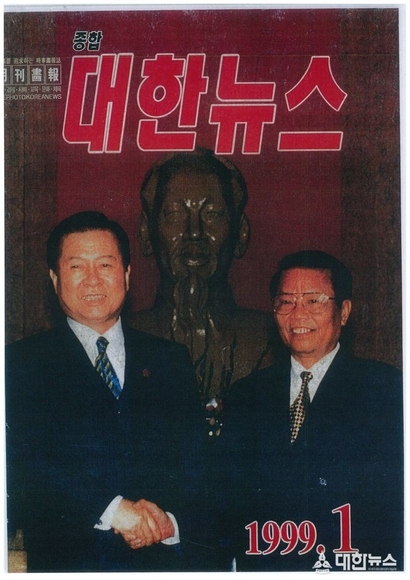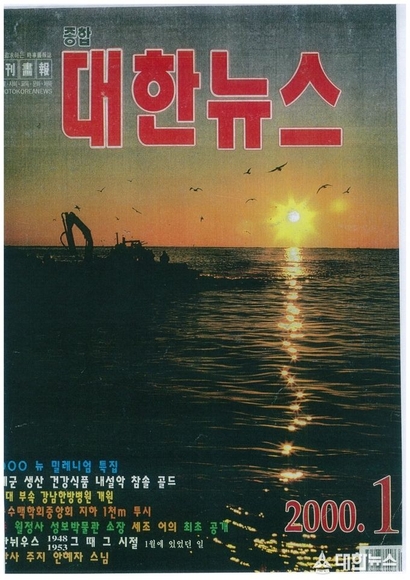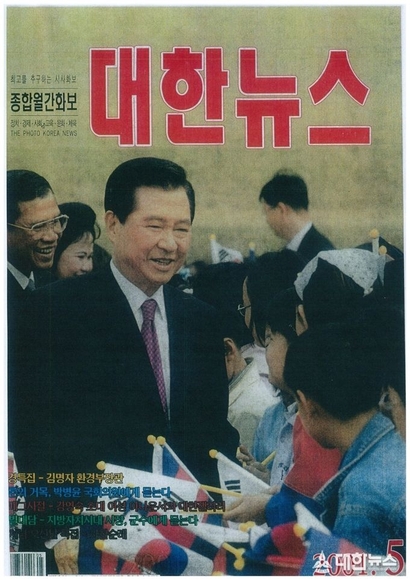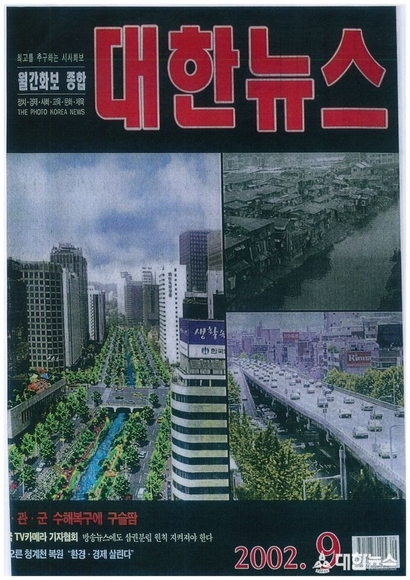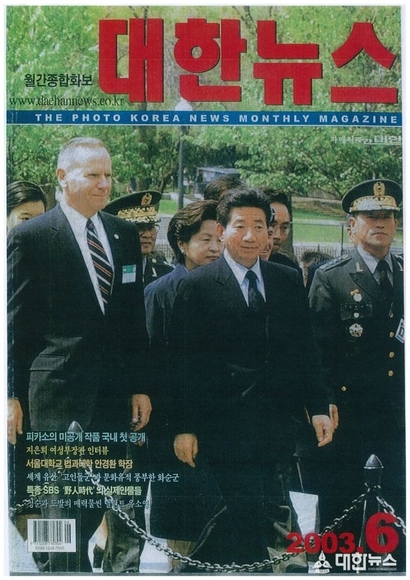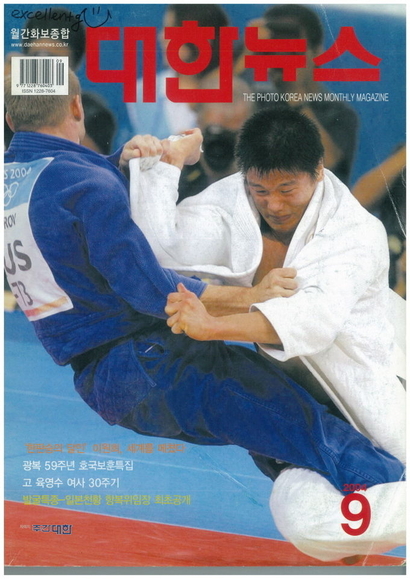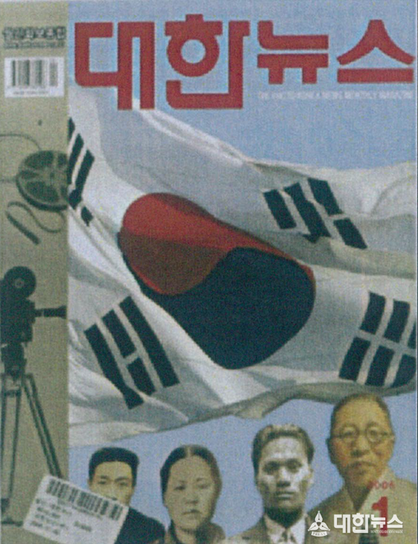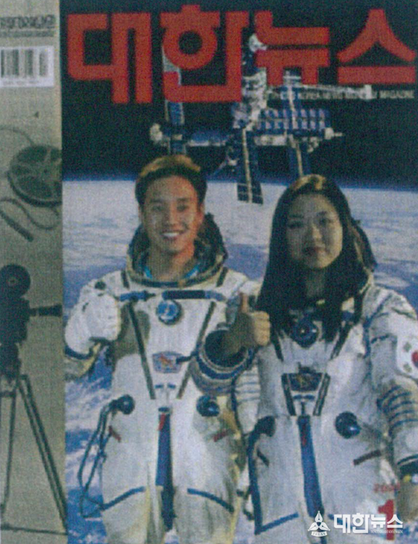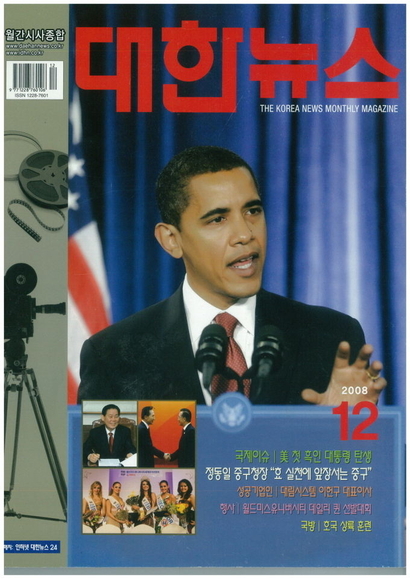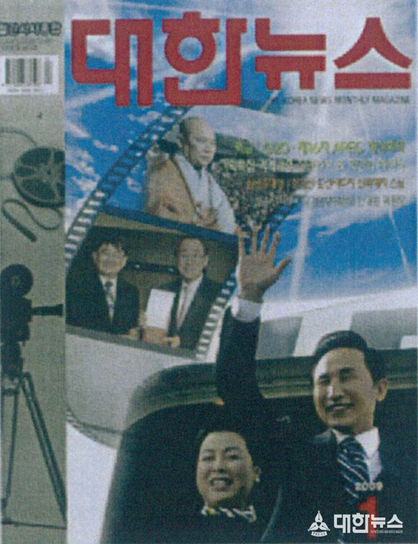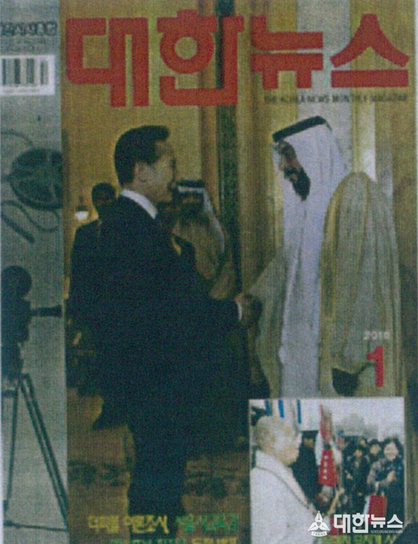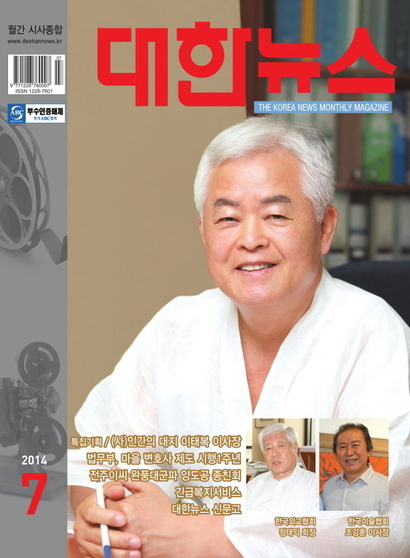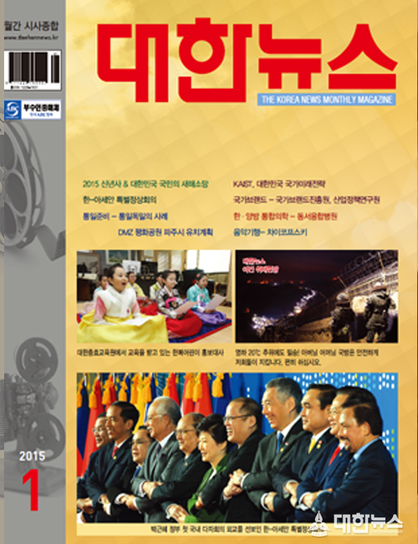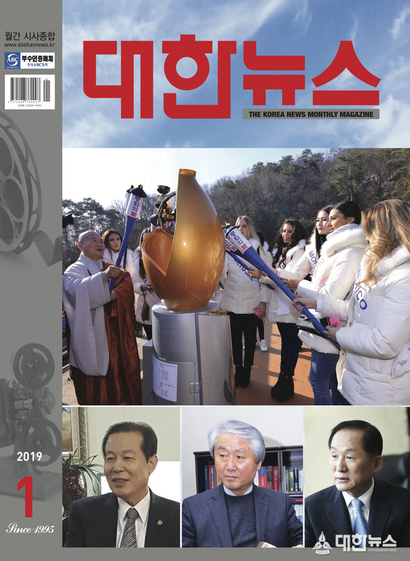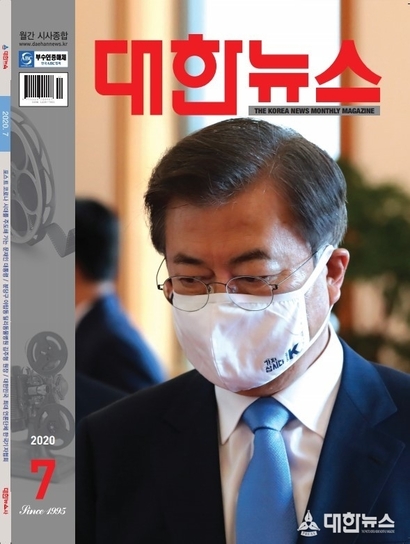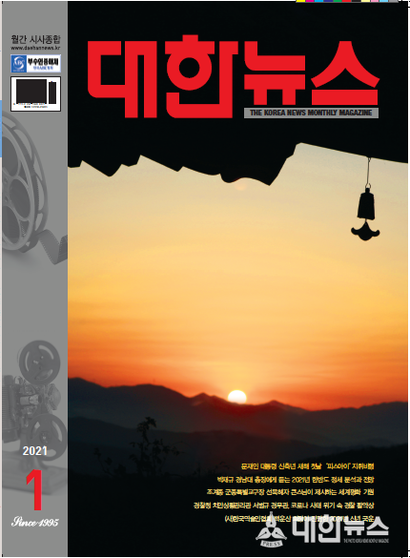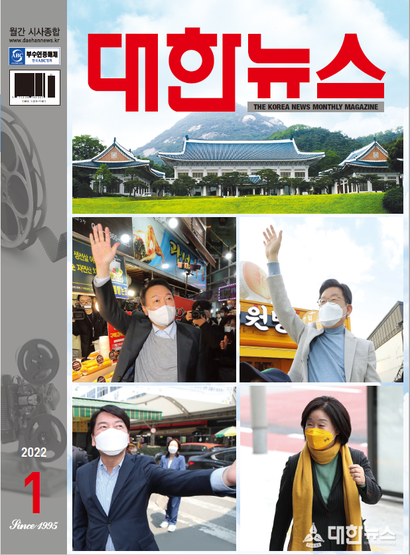(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세요?”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그려온 이상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은퇴자들의 선택은 더 복잡해지고, 더 현실적이 되고 있다.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은 단순한 ‘느림’과 ‘빠름’의 대립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전원생활의 매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삶,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일상, 도시에서 잊고 지냈던 ‘시간의 여유’는 전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작은 텃밭, 깨끗한 공기, 이웃과의 느슨한 관계는 마음의 속도를 낮추고 생활을 재정의하게 만든다. 은퇴 후 우울감이나 소속감 상실을 겪는 사람에게 전원은 회복과 재탄생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원이 주는 평안함은 조건부 행복이다.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교통은 불편하며, 겨울철 난방이나 생활 유지 비용은 오히려 더 높아질 때가 많다. 무엇보다 노년기에는 갑작스러운 병증이나 응급 상황이 잦아진다. 병원이나 응급센터까지 차로 40~50분이 걸리는 상황은 ‘전원생활의 낭만’이 아닌 ‘전원생활의 위험’이 된다. 이웃 관계가 끈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에 진입하기 어렵고, 고립이 심화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반면 도시생활은 복잡하고 번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려 있다. 병원·문화시설·대중교통·돌봄 서비스까지, 복지 자원이 압축적으로 제공된다.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유지나 안전을 생각하면 도시의 장점은 점점 더 커진다. 최근 ‘고령친화 도시 조성’이 전 세계적 흐름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년의 삶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상’이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시는 장점만 있는가. 도시가 주는 과도한 속도전 스트레스는 시니어에게 또 다른 부담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보다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은 노년기에 결코 가볍지 않다. 심지어 많은 은퇴자들이 도시 속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는 점은 모순을 넘어 중요한 경고다.
결국 은퇴 후 어디에 살 것인가의 질문은 전원과 도시의 이분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두 환경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있다. 의료 접근성,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여건, 신체 상태, 자녀와의 거리, 취미 생활 등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
전원에서 휴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고, 도시가 주는 인프라 속에서 안전과 편의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 선택이 맞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은 포기할 수 없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