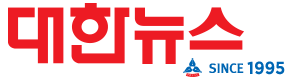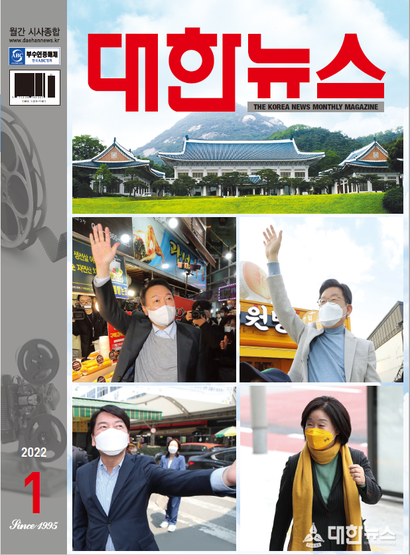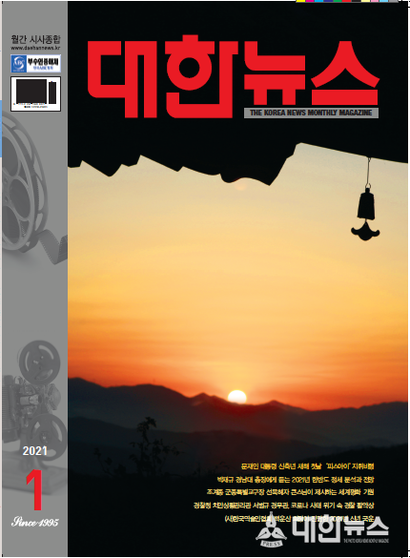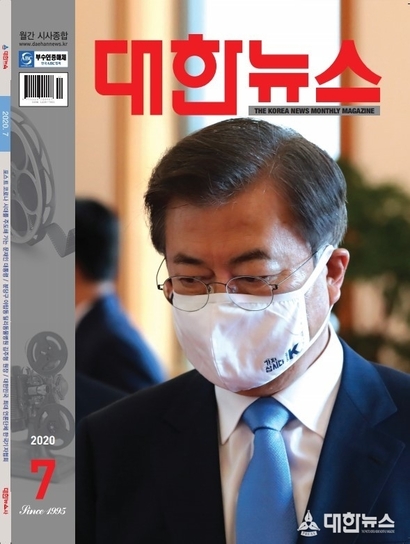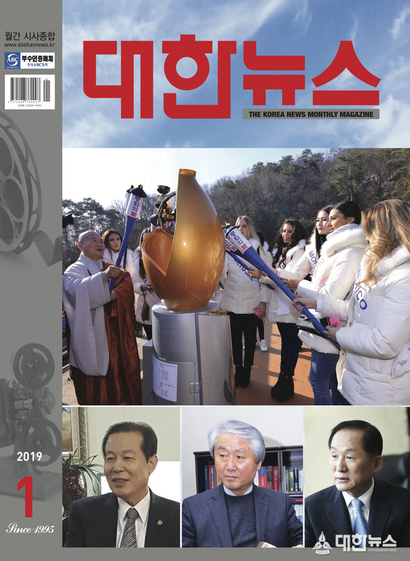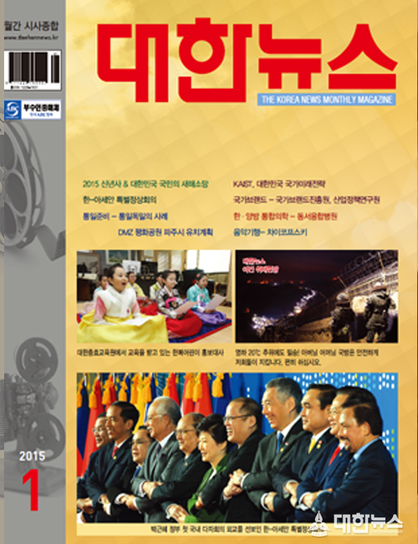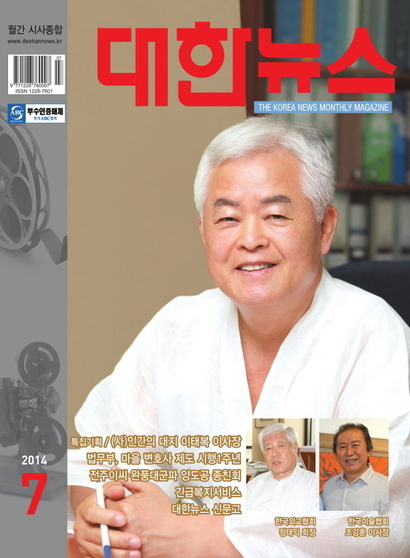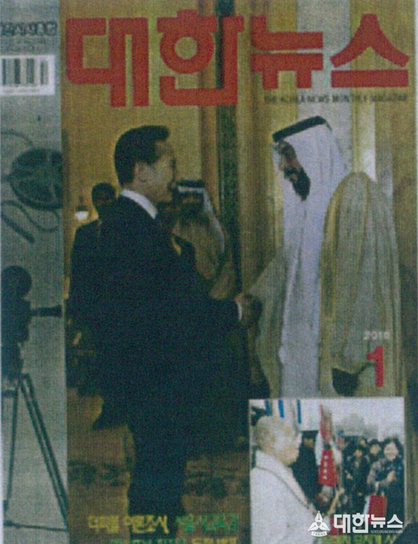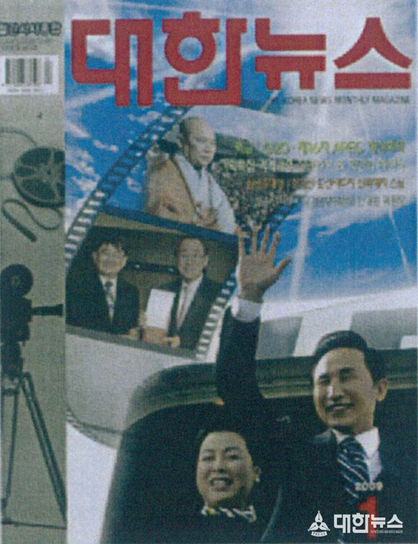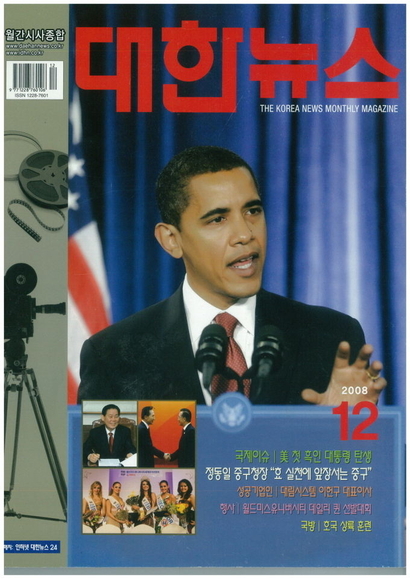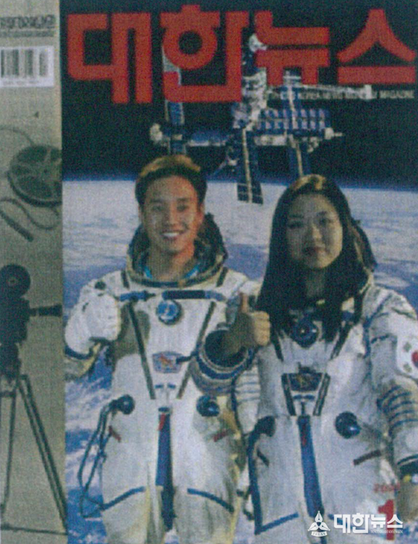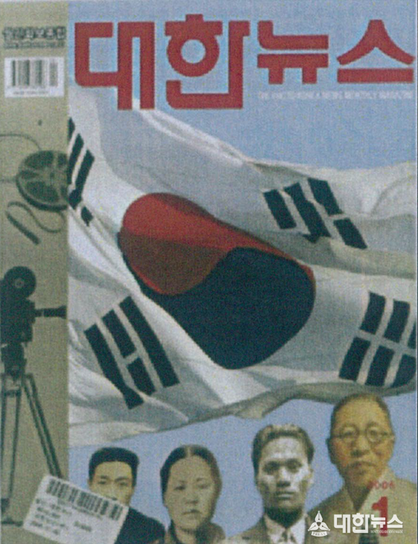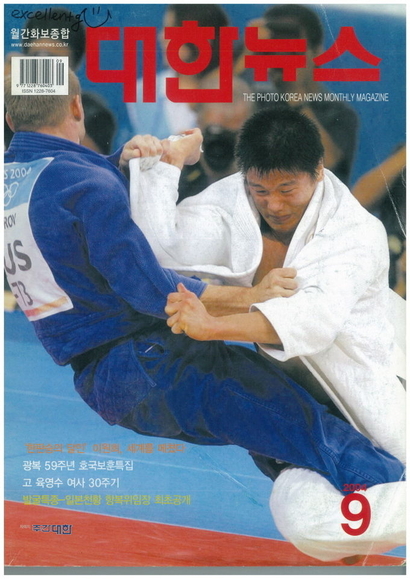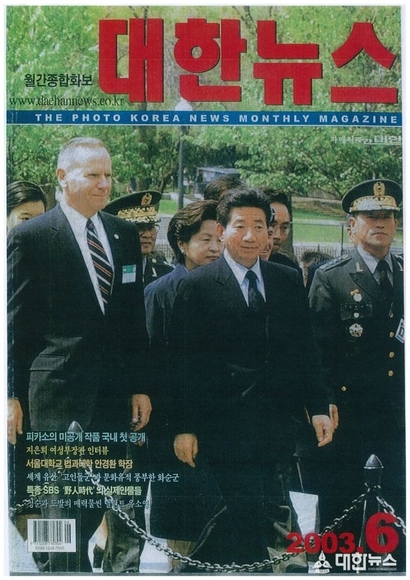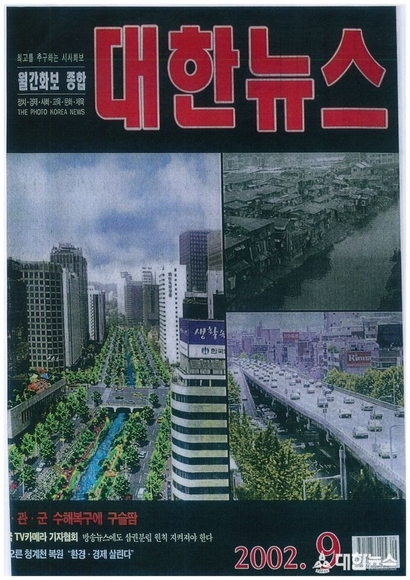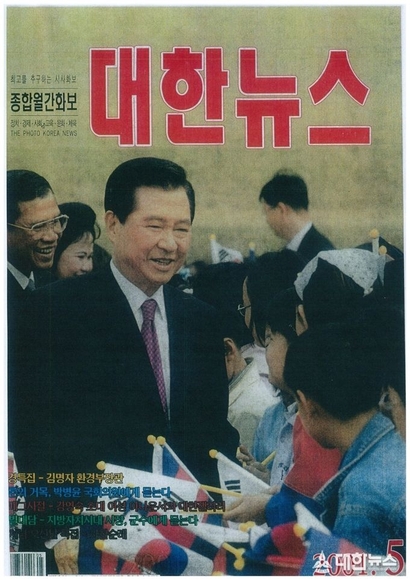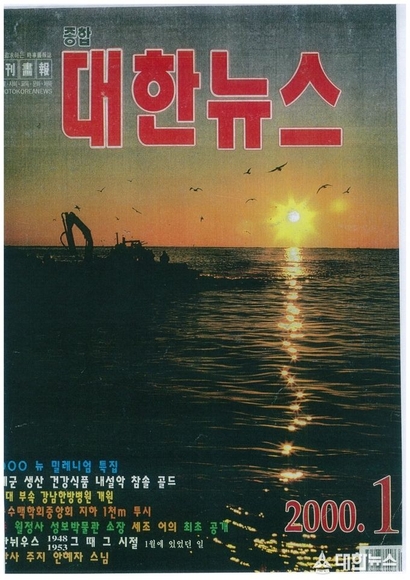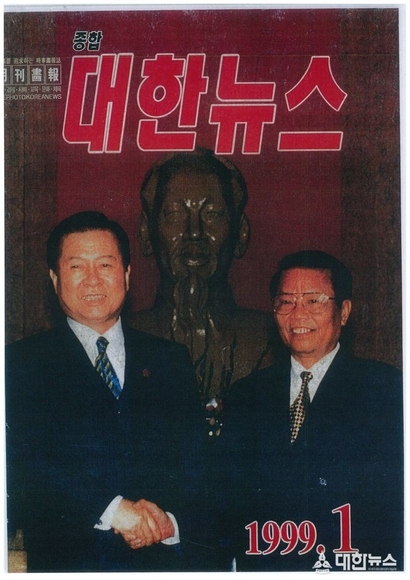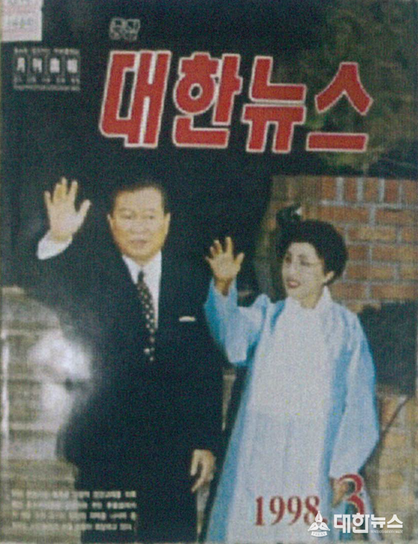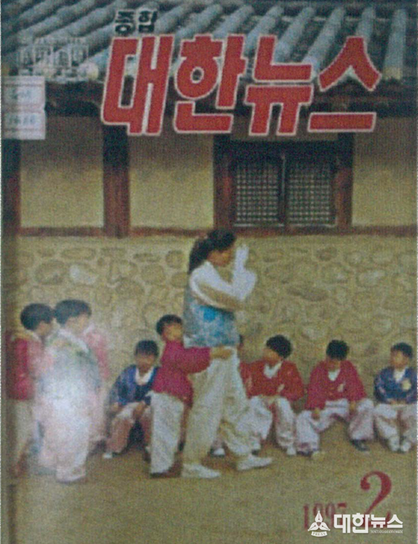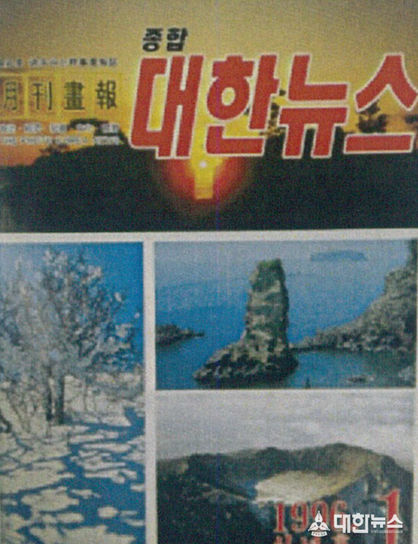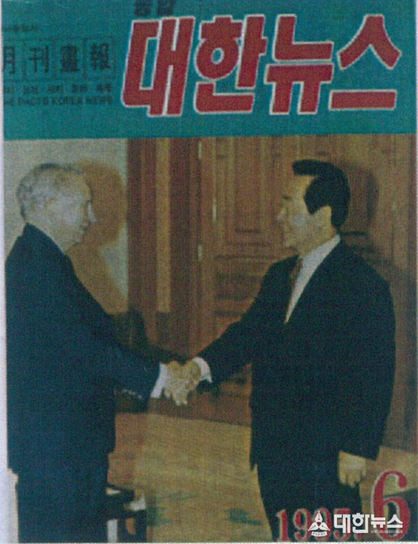|
||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직
‘첫 출근’. 약간의 흥분과 온 근육을 경직시키는 긴장감을 동반한 말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이 감정들의 크기는 더욱 크다. 10년, 20년 시간이 흐를 동안 지혜와 노하우가 쌓인 사회고참이 되어 그 시절을 반추하면, 잘 모르기에 겁 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과거 나의 모습이 사뭇 새롭다. 시대는 변했지만, 2014년을 살고 있는 20대와 30대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것이 없기에 꿈꾸고,‘열정, 패기, 젊음’이라는 유일하면서도 무한한 무기를 장전한다.
그들은 가슴 속 부푼 꿈과 면접 때“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마음가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와 달리 직장생활에서 겪는 또 다른 인간관계와, 또 다른 경쟁구도, 기대 이하의 보람, 그리고 본인 적성과의 괴리 등 다양한 이유로 좌절감과 회의감을 맛본다.
20~30대의 직장인들이 모이면 직장생활의 고충을 서로에게 털어 놓는다.“할 일이 너무 많아,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 일이 나랑 안 맞아.” 등 불평이 늘면, 결국 고심하며 직장을 구했던 나날, 잘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출근했던 날의 열정을 잊고 이직을 결심하기도 한다.
지난달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673명을 대상으로‘직장인 이직’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이직을 결심한 계기 1위는 낮은 연봉이 었고, 2위는 복지수준 및 근무환경에 불만, 3위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4위는 일에 대한 성취감 부족이었다. 2014년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흔한 이야기가 됐다. 당사자가 몰래 준비해왔던 이직에 대해 지금은 동료 혹은 상사와 진지하게 논하기도 한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 직장생활 2년 차인 28세 한 여성은“평생직장보다 평생직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학점, 어학점수, 유학경험 등이 중요한 스펙이 아니라, 직무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이 중요한 스펙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적절한 이직을 또 하나의 스펙 관리 방법으로 보기도 한다.
불합리한 취업구조, 그 안에서 성장하는 청춘
사회초년생들은 기업이 완벽한 인재를 원하며, 그 완벽함을 위한 교육비용을 취업준비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무한 경쟁 중인 20대, 30대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는 수많은 시련을 극복했어도 여전히‘전투같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 하에 너무 힘들다고 외치면서도‘청춘’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는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장 중이다. 세월 속 눈물과 기쁨의 경험으로 청년은 어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