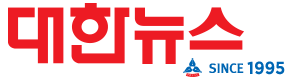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기호식품의 사전적 정의는 ‘독특한 향미가 있어 기분을 돋우고 흥분이 되는 식품’이다. 기호식품은 그 짧은 역사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파급력으로 이미 우리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자리 잡았다. 모카라떼 커피를 마시며 베스트셀러를 보거나, 마트에서 초콜릿을 카트 안에 밀어 넣으며 기호식품이 주는 작은 행복을 느끼는 일이 일상이 된 것. 여기서 잠깐,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먹을거리들은 대체 언제부터 등장한 걸까.

식생활 개선과 입맛의 서구화
1970년대에도 세계적으로 식량난은 여전해 정부는 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쌀보다 밀가루 음식 위주의 식생활과 새로운 주식으로 감자, 고구마를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혼합곡을 판매하고 무미일(無米日)을 제정하는 등 혼식을 장려해 강제적이긴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식생활이 이뤄지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유제품, 소시지, 대두유 등 기름지거나 단백질 함량이 높은 동물성 식품과 커피,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의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해 서구화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 일반화됐다. 풍부한 식생활과 소비활동은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증가되었다.
1961년 육류 소비량은 1인당 86kg에 불과했으나 1960년대 말부터 축산진홍정책에 힘입어 급증하면서 1979년엔 1인당 11kg 이상을 소비하는 등 식생활의 질이 높아졌다. 소비 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고기를 상식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불고기집 개업숫자도 증가해 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 소고깃국을 먹느냐가 부의 척도였지만, 이제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를 따질 정도로 식육의 소비가 증가했다.
기호식품의 절대강자 라면과 커피
라면은 1963년 9월에 시판된 이래 조리법이 간단하고 독특한 향미를 지니며 가격도 저렴해 10~20대 청소년층은 물론이고 서민층 가정과 군대, 산업체 등에서 널리 애용됐다. 라면의 보급으로 미곡 절약의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또 한국인의 식성에 맞게 칼국수, 냉면, 자장면 등의 갖가지 즉석면이 생산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야이 야이야~”라는 노랫말처럼 IMF 당시 모든 경제지표가 아래쪽을 향할 때 오히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 라면이다.
191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음료로 애용됐던 커피는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생활 깊숙하게 파고 들어왔다. 아침 먹은 후 모닝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면 다방에서 만나고, 차(茶)하면 커피를 연상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 광복 무렵 30여 곳이던 다방이 1969년에는 약 5,000개소에 달했을 정도로 다방중심의 커피문화는 점점 확산되었다. 1960년대에는 전체 소비량을 수입품에만 의존했는데 양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대부분 밀수를 통해 유통되고, 가짜 커피가 난무하는 등 식품위생상의 여러 문제들도 생겨났다.
1970년에 들어서자 외화 유출을 막고 미국 제품에 눌려 소비가 미미한 감로(甘露)를 대신할 국산 커피가 생산 시판됐다. 1972년에 스위스 네스 카페와 대양산업이 합작해 커피공장을 세운 이후 국산 커피 제조가 증가했고 1978년에는 동서식품, 미주산업, 시스코 등 3개 업소로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차 문화에 커피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 고유의 차에 대한 위기의식과 커피원두 수입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 낭비를 줄이고자 커피망국론이 대두됐고 대용품으로 치커리커피도 제시됐지만 커피의 습관성 마력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다.

영원한 라이벌, 콜라와 사이다
1960년대 초의 음료는 비닐에 넣은 주스나 영세업자가 만든 사이다였다. 1960년대 말 코카콜라(1968년)와 펩시콜라(1969년)의 등장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콜라의 독특한 맛과 향취가 사람의 기호를 끌어 당시 질이 낮은 국내 음료제품을 누르고 돌풍을 일으켰던 것이다. 1970년 초반까지 청량음료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이후 콜라에 눌려 있던 사이다류가 콜라류의 판매량을 앞지르기도 했다. 주스는 1960년대 초 군소 영세업자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비닐에 담긴 주스가 전부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주스는 향료를 가미한 분말을 물에 희석한 오란씨, 환타, 코커스, 미린다 등이 대중화됐으나, 제품에 사용하는 인공 향로나 색소의 안전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소득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지면서 화학음료보다는 천연식품으로 만든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 과즙음료의 개발이 활발하게 됐다. 청량음료 소비패턴이 흑(黑콜 라류)에서 백(白 사이다류)으로 바뀌고 다시 황(黃 과즙음료)으로 바뀌어 간 셈이다.
시대가 변해도 너만은 영원히
‘커피의 본능은 유혹,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사랑처럼 달콤하다’라는 프랑스 작가 타테랑의 말처럼 커피의 유혹은 시대를 초월했다. 잊을 만하면 커피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앞으로도 들을 테지만,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라면은 어떤가. 1인당 소비량이 세계 최고로 꼽히는 한국은 한 해 동안 1인당 70개의 라면을, 전 국민이 5일에 한 번꼴로 라면을 먹는다고 한다. 게다가 얼큰한 국물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우리의 라면은 진화하고 있다. 빨간라면으로 점철되던 라면 시장에 하얀 라면이 돌풍을 일으키며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이처럼 기호식품은 무한변신을 거듭하며 우리에게 기호식품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다. 개인의 입맛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식품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기호식품은 굳건하다. 가격은 비싸지면서 건강에는 썩 이로울 것 없는 기호식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식품을 향한 우리네 무한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