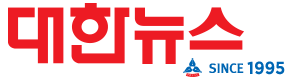|
||
| ▲ 국립극단 연극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사진=국립극단) | ||
2014년 국립극단 가을마당의 문을 여는 화두는 ‘삼국유사’이다. 천년의 고서이자 한국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의 고전을 새로운 창작극으로 만들자는 기획으로 국립극단 2012년 가을마당에서 [삼국유사 프로젝트]를 선보인 바 있다. [삼국유사 연극만발]시리즈는 좀 더 젊은 연출과 작가들의 작품으로 과감한 도전의 문을 연다.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발굴해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작품 제작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데서 나아가 고유의 레퍼토리로 정착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전서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연극적 상상력이 과거와 현대의 간극을 뛰어넘어 동시대의 감각을 입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화두를 던진다.
삼국유사 연극만발 마지막 작품은 배요섭 연출의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이다. 혜공과 원효처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입장이 되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화두 속에 단순하지만 깊은 생의 진리를 찾아가 본다.
일연은 오랜 세월 국존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감각이나 정치 감각이 탁월했을 것이다. 그는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르러 기이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역사서를 썼다. 일연에게 역사란 이러한 기이한 힘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연출 배요섭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과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말한다. 작품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불교의 깨달음 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이분법적인 인간의 언어를 가뿐히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세계인 동시에 지금까지와 다를 것 없는 소박한 세계인 것이다. 매일 산 것들을 죽여 입에 넣고, 아랫구멍으로는 똥을 누어야만 살 수 있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은 몸, 성스럽지도 속되지도 않은 인간의 ‘몸’이 작품의 언어이자 주제가 된다.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전체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 말하는 배요섭 연출은 배우들의 훈련과 연습과정을 수도승들의 수행과정에 비유한다. 연출과 배우들은 강원도 화천의 연습실에서 마치 고행을 하듯 작품을 준비했다고 한다. 스님이기도, 광대이기도, 배우이기도 한 이들은 우리에게 몸과 영혼과 언어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포항의 운제산 동쪽 항사동에는 천 수백 년 오랜 세월 등불을 밝혀오는 오어사(吾魚寺)라는 절 하나가 있다. 본래 이름은 항사사(恒沙寺). 이 절이 오어사로 불리게 된 것은 사연이 있었다. 하루는 젊은 수행자와 나이 많은 고승이 어울려 항사동 시냇물에서 고기를 잡아먹었다. 그리고는 돌 위에 걸터앉아 대변을 보았다. 혜공이 변을 가리키며 ‘여시오어(汝屎吾魚)’라고 희롱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지만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는 해석이 이 설화의 구조상 가장 적절할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속에 똥을 누었더니 그 물고기가 문득 살아났기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 고기라고 했다는 설화가 조선 초기까지도 세상에 전해지고 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