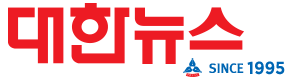|
||
| ▲ [신간] 소설 ‘프레임’ (사진=일리) | ||
아날로그 시대의 영화필름 한 장을 프레임(frame)이라고 불렀다.
프레임은 ‘틀’이라는 뜻으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요즘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이다.
미디어 연구가인 토드 기틀린(Todd Gitlin)은 “대중매체의 보도가 ‘프레임’에 갇혀서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이라는 뉴스를 접하며 온 나라가 흥분하는 것을 경험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시작하면 무자비한 돌팔매를 날린다. 그리고 세상은 덩달아 흥분하고 분노한다.
가해자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대중은 분노를 쏟아내고 대중은 그 범죄를 천인공노한 죄악으로 조명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할 것 없이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공격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다. 곧 우리는 모두 프레임에 갇히고 만다.
소설 ‘프레임’은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을 다뤘다. 미모의 여대생이 실종되고 곧 싸늘한 사체로 발견된다. 경찰은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하며 범인을 쫓는다.
범인을 검거한 후, 사건의 흐름에 따라 마녀사냥과 낙인찍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가두기’ 가담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도 못한다. 이 사회의 가장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법조인과 의료인, 언론인 등의 등장인물들은 그들조차 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틀에 갇혀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잣대를 들이대지만 프레임에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이 소설은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가해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한 용기 있는 검사가 위증 혐의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저자는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전형들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죄인’, ‘범죄’, ‘벌’을 구분한다.
나아가 죄인들의 전형적인 ‘꼼수’와 ‘속성’을 그린다. 결국, 우리는 왜 죄인이 ‘진술의 위증’과 ‘위증의 진술’을 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묘사한 것이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당사자들을 향해 우리는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격을 가한다. 익명으로 하는 것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짧은 생각으로 벌인 행동으로 한 일은 우리 자신을 가둔다. 깃발을 올리고 목표를 지정한 자의 숨은 의도를 따라서 사람들은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두는 것이다.
저자 정병철은 20여 년 동안 사건 현장을 누빈 신문기자 출신이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특정 사건을 소설화하면서 ‘당신도 프레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화두를 소설 ‘프레임’을 통해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