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십이지장궤양은 만성적인 소화관의 질병으로 위나 십이지장 점막 피가 손상되어 분화구 같은 상처가 생기고 점막하의 조직에까지 손상을 입는 질환이다. 특히 청· 장년층의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쉽게 발생하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낫기도 하지만, 자칫 방치 할 경우 위나 장의 벽에 구멍이 뚫리거나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한국인 두 사람 중 한 명꼴로 위장질환에 시달리거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에 이른다고 한다. 위·십이지장궤양의 원인은 첫째 식생활의 무절제한 포식 때문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아직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좋은 음식, 그리고 배부름의 유혹을 빠져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생활 속의 스트레스 또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도 궤양치료에 흔히 신경안정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위·십이지장 궤양의 증상은 상복부가 은은히 아프고, 지지는 듯 한 통증과 찌르는 듯 한 통증 그리고 명치끝에 아프고 트림이 나며 신물이 올라오기도 한다. 심한 경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향하는 곳이 약국이다. 약국은 약만 파는 곳이 아니다. 수백만 원짜리 고가 의약품을 비롯해 몇천 원짜리 면봉과 때비누, 염색약 등 여러 가지를 취급하는 독특한 곳이다. 한마디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또한 약국에 가면 약사에게 언제든지 건강 상담도 가능하다. 약국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환자라면 어떤 약국을 갈까? 대형 병원 근처의 약국은 언제나 어디나 붐빈다. 처방전 받은걸로 집 근처 동네 약국에 가면 원하는 약이 있을까? 약값은 어디가 더 쌀까? 약이 싸다고 좋은 약국, 조제가 빠르다고 좋은 약국은 아니라고 한다. 약사 면허증이 잘 보이며 명찰을 착용하고 있는 곳이 좋은 약국이다. 그 외 좋은 약국은 약 봉투에 어떤 약인지 알아보기 편하게 큰 글씨로 표시하기도 한다. 복용 방법이 복잡한 약은 먹기 쉽게 포장해주는 곳도 있다. 또한 환자의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약사도 있다. 그만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환자라면 충분한 설명 없이 가격만 싼 약국을 선택하지 말자.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약사 한 명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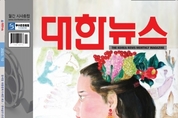
CONTENTS 2023 September, October VOL.271 12 대한뉴스 갤러리 14 그때 그 시절 정치&이슈 20 대통령 순방 28 국방 32 국회 경제 38 궁뜸 42 한국급유선선주협회 46 국제유가 고공행진 50 고사성어 사회 54 국화도 이재철 이장 59 국화도의 베트남 커피 60 마섬포구의 애자네 61 가을맞이 제철 수산물 62 약초와 독초 65 이의상 천연물연구소장 72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76 역사 토막상식 78 포토뉴스 문화와 생활 84 추석음식 Yes or No 88 햇밤 90 추석 전통놀이 94 선물 노하우 98 가수 이부영 102 여행-몽골문화촌 108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자체 116 서울 뉴스 117 경기 뉴스 118 경남 뉴스 119 경북 뉴스 120 부산 뉴스 121 충남 뉴스 122 충북 뉴스

모든 구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중추 혹은 허리 부분이라고 일컫는다. 허리가 튼튼해야 나머지 구성물들도 제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허리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위치에 있다. 심지어 허리가 부실할 경우 작은 물건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흔히 허리가 부실하면 성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들을 하기도 한다. 허리병 중에서도 다른 종류의 요통은 줄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추간판 돌출(디스크)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추간판 돌출때문에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일명 좌골신경통이라고 한다. 몸을 무리하여 다쳤을 때 가볍게 생각하고 치료를 등한시 하다보면 결국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당기면서 쑤신다. 심할 때는 걸을 수가 없고 아픈다리가 근육이 연약해 지면서 가늘어지는 수 도 있다. 정상적인 인간의 경우 척추는 총24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목부위의 경추가 7개, 가슴과 등허리부분의 흉추가12개, 그리고 허리부분의 요추가 5개인데 이 척추와 척추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섬유성 연골로써 흔히 추간판, 또는 디스크라고 한다. 이것은 척추가

고종은 냉면 마니아였다? Yes! 매운 것을 싫어하는 고종(1852~1919)이었지만 냉면만큼은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그는 겨울밤이면 야참으로 냉면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고기 육수에 편육, 배, 잣을 올려낸 '왕실 냉면'은 뜻밖에도 궁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대한문 밖에서 사 온 것이다. 냉면을 사랑한 왕은 또 있다. 임유한의 '임하필기'에는 순조 (1790~1834)의 냉면 이야기가 나온다. 순조는 야심한 밤에 달구경을 하다 군직자들을 시켜 냉면을 만들게 한 후 같이 먹었다고 한다. 냉면은 다이어트에 좋다? Yes! 냉면다이어트는 일반 식사가 한 끼에 800Cal 내외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한 끼를 냉면으로 먹으면 300~400Cal 줄일 있다는 데 착안했다. 실제 양념과 건더기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00g을 기준으로 냉면은 400~550Cal 정도다. 물냉면이 가장 칼로리가 낮고 비빔냉면, 칡냉면, 회냉면 순서다. 같은 양의 메밀국수 칼로리는 물냉면의 30%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빔냉면은 염분이 많아서 고혈압 또는 심장병 환자의 다이어트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냉면은 20세기 음식

인간은 언제부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었을까?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됐다. 고대 중국인들이 눈과 얼음에 과일즙을 섞어 먹었다는 것이 가장 오랜 기록이다. 옛 이집트나 바빌론에서도 설탕을 친 과일을 얼려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동양의 푸른 중앙초원에서는 목축과 농경 생활을 함께했다. 중국 사람들은 기원전 3000년경에 눈과 과일즙을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한다. 또 공자 시대에 석빙고를 사용하여 얼음이나 눈을 보관했다는 기록도 있다.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꿀과 과일즙,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노예들이 산에서 가져온 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환자들에게 얼린 음식(Frozen Food)로 식욕을 돋워 주었으며 1세기경, 네로 황제는 포도주에 과일 섞은 것을 알프스산에서 가져온 얼음에 얼려 먹었다. 아이스크림이 유럽에 알려진 것은 1295년부터이다. 1292년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와 물과 우유를 얼려 만드는 법을 유럽에 전했다. 중국 북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마르코 폴로는 1292년 <동방견문록>에서 중국에서 즐겨 먹던 프로즌 밀크의 배합 비법을 북부 이탈리아에 전파했

우리 식으로 주세법을 만들어 발전시켰다면 현재 우리 술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얼마 전 韓·日 정상 만찬장에서 사용된 술 ‘경주법주 초특선’이 우리나라 고유의 청주가 아닌 일본 청주인 ‘사케’(さけ)라며 양조업계와 주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경주법주 초특선은 우리 청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점점 알코올도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TV 광고를 할 수 있어서라는데 경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공업의 발전과 주세행정의 합리화와 근거과세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세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세청 소속하의 중앙연구행정기관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주류를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주세행정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1909년 10월 1일 舊 한국 정부 탁지부 소속 양조시험소가 창설됐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6월 재무부 소속하에 양조시험소 설치, 1966년 3월 국세청 발족에 따라 국세청양조시험소로 개편, 그 후 2010년 12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기구를 개편하고 2015년 10월 제주 서귀포 청사로 이전했다. 설립된 이래 100년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MZ세대들에게 1960년대는 어쩌면 그저 낯설거나 혹은 관심 밖의 시대일 수도 있겠다. 1960년대는 도시화, 산업화로 대변되는 시대다. 특히 1962년 국가가 주도했던 산업육성정책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농촌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광복 직후 서울의 인구는 80만명 정도였으나 1960년 서울의 인구는 24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서울의 성장은 우리나라 도시화의 과정을 거의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도시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 이후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촌향도(離村向都)의 물결이 밀어닥 치게 된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도시인구의 비율은 1966년에 34%, 1970년에 41%로 늘었다. 1966~1970년 동안의 서울의 인구중가는 매년 평균 40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는 우리나라 전 체 인구증가의 7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재건운동의 유행으로 젊은 남녀 '재건데이트' 유행 1963년에는 시골 어린이가 배가 고파서 술도가의 술 찌꺼기를 얻어먹고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책상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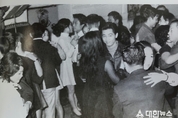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1950년대 중반 출간된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대학교수의 부인인 선영이 권태로운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사교춤을 배우며 내용이 전개된다. 주부로서 집안 일밖에 모르던 그녀가 자유를 꿈꾸며 세상 밖으로 나서게 되고 곧 젊은 남자와 불륜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선영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편이 용서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 소설은 당시 여성단체로부터 '여성을 모욕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품이라며 고발을 당했지만 10만부가 넘게 팔려나가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1956년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개봉했다. 소설 '자유부인' 은 장안의 화제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지만 당시 성도덕 관념의 변화 등 당시 사회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당시 자유부인 선영이 비난을 받았던 것은 가정주부가 외간 남자와 불륜에 빠졌다는 설정에 있었지만 그보다 큰 원인은 춤(맘보)에 있었다. 미풍양속과 어긋나는 춤바람이 났고 외간 남자와 정분이 났기 때문이다. 춤을 허락해 주세요 1935년 축음기 보급은 30만대를 넘어서고 레코드의 보급이 춤바람을 몰고 왔다. 1937년 잡지 <삼천리>에 일본레코드회사

(대한뉴스 안상훈 기자)=과거에는 전화 교환수를 통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었다. 전화교환원이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온 것은 1902년 3월 20일에 대한제국 통신원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성과 인천 사이에 전화를 임시로 설치하면서부터다. 당시 전화는 전화를 걸면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었다. 자석식이라고 해서 전화기의 핸들을 돌리면 교환원이 나오는 것과 공전식이라고 해서 전화기를 들면 교환원이 나오는 방식이었다. 이 둘 모두 중간에서 전화를 연결해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화교환원이었다. 1971년이 되자 전화교환원 없이 전화를 건 사람이 직접 다이얼을 돌려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자동식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후 자동식 전화의 출현과 더불어 1987년 이루어진 전국자동교환망의 완성으로 전화교환원 없이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화교환원이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됐다. 그 시절 전화사업이 시작된 초기의 전화교환원은 대부분 남성이었으나 1920년대 이후에 여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고객을 응대할 때 밝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