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0년 3월 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식 (대한뉴스 정미숙기자)=2023년 3월 1일은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일이다. 그럼 제1회 삼일절 기념일은 어디서 어떻게 열렸을까?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3.1절 기념식을 교민들 7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나름대로 성대하게 치렀다. 올림픽 대극장을 빌려 대형 태극기를 걸고 '독립만세'라고 적힌 휘장도 붙였고. 태극기를 세계 여러 나라 국기, 만국기와 함께 장식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황태는 매서운 겨울철 눈보라와 청정한 봄바람 속에서 말리는 명태를 말한다. 황태라는 이름은 함경북도 명천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명태를 말려서 노랗게 변한 것을 지칭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6·25 발발후 함경도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고향의 황태를 잊지 못해 속초, 묵호등지에서 정착해 황태를 만들다가 대관령 일대를 살피다 횡계리를 찾아내 최초로 황태 말리기 작업을 시작하여 생산했다. 뒤를 이어 또 다른 함경도 실향민들이 대관령 근처 용대리에 대한민국 최초로 덕장을 만들고 1964년에 대관령 황태덕장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 김활란(1899-1970)은 일제강점기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재단이사장, 대한기독교교육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개신교인이다. 김활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양분되어 있다. 여성 계몽 운동 및 인권 운동에 커다란 공헌을 남겼다는 평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독재 인사라는 평가다. YWCA를 설립했으며 여자들의 문맹 퇴치, 여자 교육 활성화, 여자의 사회활동 참여, 남존여비의 인습 타파 등 조선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운동에 동참했고 농촌교육을 통한 문맹퇴치등 계몽활동에 주력했다. 반면에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친일활동에 가담하여 각종 단체를 결성하거나 발기인으로 참석하는 등 일제의 조선인 동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화여자대학 초대 총장이었으나 이화여대 재학생들은 동상 철거를 요구하거나 페인트로 더럽히기도 했다. 얼마 전 타계한 고 김동길 교수는 김활란의 친일 행적이 당시 이화여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기고를 하기도 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1968년 2월 27일 한국일보사에 불이나 구관 4층 건물이 전소되고 7명이 순직했다. 불은 윤전실에서 산소 용접 중 불똥이 윤활유에 튀어 발화, 연1천 5백여평을 순식간에 태우고 1시간15분 만에 진화됐다. 이후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설계되어 사옥 건너편 동십자각 앞 큰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삼각주 형태의 대지에 세워진 한국일보 사옥은 2006년 경영악화로 38년을 뒤로 하고 사라졌다.

1971년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춘천 공지천에서 열렸다. 동계체육대회는 한강 특설링크에서 개최된 최초의 전국 규모 빙상대회인 1920년 ‘전조선 빙상경기대회’를 효시로 삼고 있으며, 50-60년대까지는 날씨등에 따라 서울 한강, 원주, 춘천 공지천등을 옮겨 다니며 개최했다. 이후 1972년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개장되면서 빙상대회는 태릉스케이트장과 동대문 실내링크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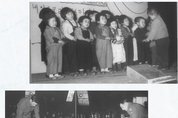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어렵고 못살았지만 꿈을 키우며 지내던 시절을 반추해보면서 우리의 불우이웃과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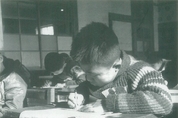
1960년대 "국6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시절이 있었다. 본고사를 치르고 나면 체력장 시험이 있었다.69년부터는 소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시행되어 소위 뺑뺑이 세대가 시작되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원각사는 한국 최초의 극장으로 1908년 지금의 서울 광화문 새문안 교회 자리에 세웠다. 로마식 극장을 본떠 만들었으며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었다. 1960년 12월 5일 전소되고 원각사를 복원하자는 취지로 지어진 것이 1995년 문을 연 정동극장이다.


1956년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 정부는 1956년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있다.